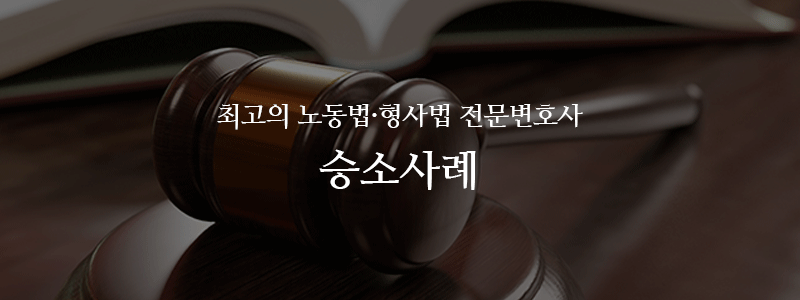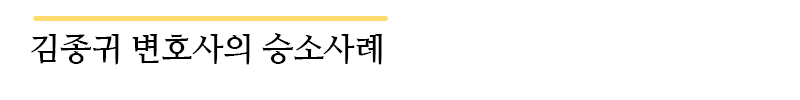-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 1
-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 2
-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 3
-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 4
-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 5
-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 6
-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 7
-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 8
-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 9
-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10
-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11
-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12
-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13
-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14
-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15
-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16
-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17
-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18
-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19
-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20
-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21
-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22
-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23
-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24
-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25
-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26
-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27
-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28
-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29
-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30
-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31
-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32
-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33
-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34
-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35
-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36
-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37
-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38
-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39
-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40
-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41
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35
[백혈병/산재]
▶백혈병 사건(산재) 성공 사례
-
산재소송절차, 산재소송 시작부터 판결선고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립니다 l 노동법·형사법전문변호사 김종귀 변호사
youtube.com
안녕하세요. 김종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의 백혈병 사건 최근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변호사 1-2년차였을 때 산재 사건을 40건 넘게 수행했었습니다. 해고, 임금, 산재 등 거의 노동사건을 하는 사무실(법률사무소 새날)이었는데 저는 해고와 임금 분야 송무·자문도 했지만 산재 송무를 특히 많이 수행했습니다. 사고성 재해, 근골격계 질병, 과로성 질병 분야를 골고루 했었는데요, 백혈병 사건은 딱 1건 했었습니다. 함께 일했던 노무사님(권동희 노무사님)이 산재 전문으로 굉장히 유능하셔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성공 사례는 유족급여신청 사건입니다. 제 의뢰인(원고)은 망인의 부모님입니다. 유족급여의 경우 배우자가 1순위인데 망인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 없이 사망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1순위가 되었습니다.
망인은 공고를 졸업하고 2년 가까이 ㈜00전기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퇴사한 시점이 2007년입니다. TV 안에 들어있는 복잡한 회로기판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회로기판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망인은 많은 공정 중에서 맨 마지막 공정에서 일했습니다. 회로기판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는 공정이었죠.
망인은 2007년 퇴사 후에 군대에 다녀와서 이런 저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2012년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약 2년 동안 투병하다가 2014년에 사망하였습니다.백혈병 진단 후에 2014년초에 업무상질병을 이유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심리 도중에 사망하여 2014년 말에 유족급여신청을 추가로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말에 모두 불승인처분을 했습니다.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2016년초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백혈병 사건의 핵심은 근로자가 백혈병의 원인이 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대표적인 유해물질이 벤젠,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입니다. 백혈병 사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합니다. 그 역학조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학조사에서 벤젠 등이 일정 농도 이상으로 나오면 근무기간, 잠복기 등을 고려하여 산재승인처분이 내려지죠.
역학조사는 사업장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당연히 2-3주 전에 사업장에 연락을 하죠. 이 사건에서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사실조회를 해서 사업장에 역학조사 예정일을 통보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사업장은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환기에 신경을 썼을 겁니다. 사업장에서 백혈병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역학조사에 특별히 신경을 씁니다.
역학조사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미량 검출되었고, 벤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가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미미하고 벤젠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극히 미량이었을 것이라며 업무와 백혈병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업무상질병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질판위 판정에 따라 불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고와 달리 질병의 경우 필수적으로 질판위를 거치고, 근로복지공단은 100% 질판위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실무입니다.
산재 사건 송무는 피재근로자가 했던 업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근골격계 질병 중 요추 추간판 탈출이라면 피재근로자의 업무가 허리부담 작업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뇌경색·뇌출혈·심근경색과 같은 과로성 질병이라면 피재근로자의 과로·스트레스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헤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혈병 사건의 특징은 그 업무 파악이 꽤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소한 화학물질 이름도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유족급여 사건과 같이 피재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동료 근로자의 도움이 없으면 정말 막막합니다. 업무내용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다행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산재사건은 감정을 잘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신청을 할 때 감정질의사항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첨부서류에 무엇을 넣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한 후에 감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 진료기록감정이라고 하는데요, 산재사건 경험이 많지 않은 변호사님은 무턱대고 의무기록지를 첨부해서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각종 사실조회 결과, 증인신문 결과를 첨부해서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사업장은 물론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관할 노동청, 회사에 유기용제를 제공한 협력업체, 주치병원 등에 사실조회신청을 했고, 당시 동료근로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였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를 촘촘하게 진행해서 최대한 유리한 내용을 끌어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역학조사서가 불승인처분의 출발점이자 근거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최대한 흠집을 내서 감정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감정은 한 개의 진료과목에 1회 신청합니다. 뇌혈관질환이라면 신경외과(뇌혈관), 허리 추간판탈출증이라면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척추)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2단계에 걸쳐서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학회에 유해물질평가감정(어떤 유해물질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을 실시하였고, 다음으로 직업환경의학과에 상당인과관계평가 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유해물질평가감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의 문제점과 한계를 인정받는 데에 주력하였고,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에서는 유해물질평가감정까지 첨부자료로 제출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감정 결과가 좋은 경우에 1심에서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장이 근로복지공단에게 조정권고를 하고 피고가 조정을 수락하면 끝나는 절차입니다. 조정권고는 유족급여승인처분을 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행정사건의 경우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공권력행사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임의로 조정을 수락할 수가 없습니다. 소송업무에 있어서 감독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결정합니다. 실무상 거의 100% 수락합니다. 재판장의 조정권고를 수락하지 않으면 100% 원고승으로 결정되기 때문이죠(즉 근로복지공단 패소). 조정으로 끝나면 소송비용 각자 부담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조정권고를 수락할 유인이 있는 것입니다.
판결로 이기면 변호사비용으로 440만원, 인지·송달료·감정료 합계 약 150만원, 총 600만원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포기하더라도 신속하게 유족급여승인처분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여 우리 원고측은 조정권고를 수락하였습니다.
조정과 관련해서 제 경험을 좀 더 말씀드리면, 근로복지공단은 1심에서 패소하면 무조건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조정권고를 유도해서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끝내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정으로 끝나면 판결문 작성 부담이 없기 때문에 조정을 선호하기 마련이죠. 저는 ‘소송비용 피고 부담’으로 조정을 받아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소송마다 승패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업주에 대한 사실조회 과정에서 기판 생산량 자료를 입수하였기 때문입니다. 역학조사서를 보니 기판을 자르는 기계가 8대가 있었는데 역학조사 당시에는 1대만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역학조사에 대비하여 1대만 작동시킨 건 아니고 해당 기판의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는 기판을 여러 조각으로 자를 때 열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유해물질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회사에 대하여 망인이 입사한 2005년부터 역학조사 당시까지 생산량이 표시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회사가 순순히 자료를 내주었습니다. 회사측은 그 자료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모르고 내주었을 것입니다.
회사가 제출한 생산량 자료를 확인해보니 망인이 일했을 때에는 역학조사 시에 비하여 생산량이 50배에서 100배나 많았습니다. 그만큼 망인이 포름알데히드에 더 많이 노출되었을 것이고,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겠죠? 이 논리를 강하게 밀어부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차례 감정을 거치면서 소송이 3년 넘게 걸리긴 했지만 다행히 1심에서 조정으로 잘 마무리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백혈병/산재]